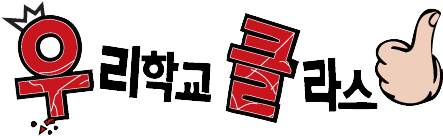вҖң200л§Ң мӣҗм§ңлҰ¬ мң„н—ҳмҡ”мҶҢ?вҖқ л””м§Җн„ё мӮ¬мқҙл“ңлҜёлҹ¬ 1л…„ мӢӨмӮ¬мҡ© нӣ„кё°






비 мҳӨлҠ” лӮ лҸ„ мһҳ ліҙмқёлӢӨлҚ”лӢҲвҖҰ вҖҳк·ё н•ңкі„вҖҷк°Җ мғқлӘ…мқ„ мң„нҳ‘н• мӨ„мқҖ лӘ°лһҗлӢӨ
мөңк·ј мһҗлҸҷм°Ё м—…кі„м—җм„ң мЈјлӘ©л°ӣкі мһҲлҠ” вҖҳл””м§Җн„ё мӮ¬мқҙл“ңлҜёлҹ¬(DSM)вҖҷ. кё°мЎҙмқҳ мң лҰ¬ кұ°мҡёмқ„ м№ҙл©”лқјмҷҖ л””м§Җн„ё мҠӨнҒ¬лҰ°мңјлЎң лҢҖмІҙн•ң мқҙ нҳҒмӢ м Ғ мһҘ비лҠ” лҜёлһҳм°Ёмқҳ мғҒ징мІҳлҹј ліҙмҳҖм§Җл§Ң, мӢӨм ң 1л…„к°„ мӮ¬мҡ©н•ҙліё мҡҙм „мһҗл“Өмқҳ нӣ„кё°лҠ” мқҳмҷёмқҳ н—Ҳм җл“Өмқ„ мЎ°лӘ…н•ҳкі мһҲлӢӨ. кІүліҙкё°м—” мӢ кё°мҲ мқҙм§Җл§Ң, лӮҙл¶Җм ҒмңјлЎңлҠ” кҪӨлӮҳ вҖҳм•„м°”н•ң лӢЁм җвҖҷл“Өмқҙ м§Җм Ғлҗҳкі мһҲлӢӨ.
мҡ°м„ мһҘм җл¶Җн„° ліҙмһҗ. кё°мЎҙ мң лҰ¬ мӮ¬мқҙл“ңлҜёлҹ¬лҠ” нҸ¬м§Җм…ҳм—җ л”°лқј мӢңм•ј нҷ•ліҙк°Җ к№ҢлӢӨлЎңмӣ лҚҳ л°ҳл©ҙ, DSMмқҖ к°ҒлҸ„ мЎ°м • м—Ҷмқҙ м–ҙлҠҗ мң„м№ҳм—җм„ңлӮҳ лҸҷмқјн•ң мӢңм•јлҘј м ңкіөн•ңлӢӨ. 비лӮҳ лҲҲмқҙ мҳӨлҠ” лӮ м—җлҸ„ л¬јл°©мҡёлЎң к°Җл Өм§Җм§Җ м•Ҡкі к№ЁлҒ—н•ң нҷ”м§Ҳмқ„ мң м§Җн•ҳл©°, м•јк°„м—җлҸ„ л°қкі м„ лӘ…н•ң нҷ”л©ҙмқ„ ліҙм—¬мӨҳ мҡҙм „мһҗм—җкІҢ мғҒлӢ№н•ң мӢңмқём„ұмқ„ м ңкіөн•ңлӢӨ. нҠ№нһҲ нӣ„진 мӢңм—җлҠ” нҷ”к°Ғмқҙ л„“м–ҙм§ҖлҠ” кё°лҠҘк№Ңм§Җ к°–м¶°м ё мһҲм–ҙ мӢңм•ј нҷ•ліҙ мёЎл©ҙм—җм„ң л§ҢнҒјмқҖ 분лӘ…н•ң кё°мҲ 진ліҙк°Җ мқҙлЈЁм–ҙ진 м…ҲмқҙлӢӨ.
н•ҳм§Җл§Ң л¬ём ңлҠ” вҖҳк·№н•ң мғҒнҷ©вҖҷм—җм„ң л“ңлҹ¬лӮңлӢӨ. 비лӮҳ лҲҲмқҙ мң лҰ¬м—җ м§Ғм ‘ 묻м—Ҳмқ„ л•ҢмЎ°м°ЁлҸ„ нҷ”л©ҙмқҙ 맑лӢӨлҠ” м җмқҖ мһҘм җмІҳлҹј ліҙмқҙм§Җл§Ң, мӢӨм ң мҡҙм „мһҗл“Ө мӮ¬мқҙм—җм„ңлҠ” вҖңм№ҙл©”лқј мң„м№ҳмҷҖ мӢңм•јк°Ғмқҙ м• л§Өн•ҙм„ң мӮ¬к°Ғм§ҖлҢҖк°Җ лҚ” мғқкёҙлӢӨвҖқ, вҖңл¬јлҰ¬м Ғ лҜёлҹ¬ліҙлӢӨ м •ліҙк°Җ н•ңм •м Ғмқҙлқј мЈјн–ү мӨ‘ нҳјлһҖмқҙ мһҲлӢӨвҖқлҠ” м§Җм Ғмқҙ мҶҚм¶ңн–ҲлӢӨ. нҠ№нһҲ кі мҶҚлҸ„лЎңмІҳлҹј л№ лҘё нҢҗлӢЁмқҙ н•„мҡ”н•ң мғҒнҷ©м—җм„ңлҠ”, нҷ”л©ҙ м „нҷҳ л”ңл ҲмқҙлӮҳ м ҖмЎ°лҸ„ мғҒнғңм—җм„ң л°ҳмӮ¬лҹү л¶ҖмЎұмқҙ мӮ¬кі лЎң м§ҒкІ°лҗ мҲҳ мһҲлӢӨлҠ” мҡ°л Өк°Җ м ңкё°лҗңлӢӨ.
кІҢлӢӨк°Җ, л””м§Җн„ё лҜёлҹ¬ мһҗмІҙмқҳ н•ҳл“ңмӣЁм–ҙ мӢ лў°лҸ„лҸ„ л¬ём ңлӢӨ. н•ң мң м ҖлҠ” вҖңCCTVк°Җ кі мһҘлӮҳл©ҙ мӮ¬лһҢмқҙ ліҙмқҙм§Җ м•Ҡл“Ҝ, DSMлҸ„ м „мӣҗ л¬ём ңлӮҳ мҶҢн”„нҠёмӣЁм–ҙ мҳӨлҘҳлЎң кәјм§Ҳ мҲҳ мһҲлӢӨвҖқл©°, л¬јлҰ¬м Ғ лҜёлҹ¬мІҳлҹј вҖҳн•ӯмғҒ мЎҙмһ¬н•ҳлҠ” мӢңм•јвҖҷк°Җ м•„лӢҲлқјлҠ” м җм—җ л¶Ҳм•Ҳмқ„ н‘ңн–ҲлӢӨ. нҠ№нһҲ м°Ёлҹү мҷёл¶Җм—җ м„Өм№ҳлҗҳлҠ” м№ҙл©”лқјмқҳ кІҪмҡ°, к·№н•ң нҷҳкІҪм—җм„ңлҠ” кі мһҘмқҙ мүҪкІҢ лӮҳкі , к·ёл•ҢлҠ” мӢңм•јк°Җ мҷ„м „нһҲ м°ЁлӢЁлҗҳлҠ” вҖҳлё”лқјмқёл“ң мЎҙвҖҷмқҙ л°ңмғқн• мҲҳ мһҲлӢӨ.
л””мһҗмқём Ғмқё м§Җм ҒлҸ„ л№јлҶ“мқ„ мҲҳ м—ҶлӢӨ. DSM мһҘм№ҳлҠ” кё°мЎҙ лҜёлҹ¬м—җ 비н•ҙ лҸҢм¶ңлҗҳм–ҙ мһҲкі , л””мһҗмқём ҒмңјлЎң нҲ¬л°•н•ҳлӢӨлҠ” мқҳкІ¬мқҙ л§Һм•ҳлӢӨ. вҖңкіөкё°м Җн•ӯкіј лҜёкҙҖмқҙлқјлҠ” мһҗлҸҷм°Ё ліём—°мқҳ мҡ”мҶҢлҘј лІ„лҰ¬кі кё°мҲ л§Ң л°Җм–ҙл¶ҷмқё кІ°кіјвҖқлқјлҠ” 비нҢҗлҸ„ лӮҳмҳЁлӢӨ.
м—¬кё°м—җ мҳөм…ҳ к°ҖкІ©мқҖ л¬ҙл Ө 200л§Ң мӣҗм—җ мңЎл°•н•ңлӢӨ. вҖңмІЁлӢЁмқҙлһҚмӢңкі л№„мӢёкё°л§Ң н•ҳлӢӨвҖқлҠ” л¶Ҳл§Ң м„һмқё л°ҳмқ‘лҸ„ м Ғм§Җ м•ҠлӢӨ. мқјл¶Җ мҶҢ비мһҗлҠ” вҖңмқҙ м •лҸ„ к°ҖкІ©мқҙл©ҙ 비 мҳӨлҠ” лӮ м—җлҸ„ л¬јл°©мҡёмқ„ мһҗлҸҷмңјлЎң лӢҰм•„лӮҙлҠ” мӢңмҠӨн…ң м •лҸ„лҠ” мһҲм–ҙм•ј н•ҳм§Җ м•ҠлҠҗлғҗвҖқкі л°ҳл¬ён•ңлӢӨ.
кІ°лЎ м ҒмңјлЎң, л””м§Җн„ё мӮ¬мқҙл“ңлҜёлҹ¬лҠ” 분лӘ… лҜёлһҳм§Җн–Ҙм Ғмқё мһҘ비лӢӨ. н•ҳм§Җл§Ң мӮ¬мҡ©мһҗ кІҪн—ҳм—җ кё°л°ҳн•ң лӢӨм–‘н•ң н”јл“ңл°ұкіј к°ңм„ мқҙ мҲҳл°ҳлҗҳм§Җ м•ҠлҠ”лӢӨл©ҙ, мқҙлҠ” вҖҳлҜёлһҳмқҳ м•Ҳм „мһҘм№ҳвҖҷк°Җ м•„лӢҲлқј вҖҳнҳ„мһ¬мқҳ мһ мһ¬м Ғ мң„н—ҳ мҡ”мҶҢвҖҷк°Җ лҗ мҲҳ мһҲлӢӨ. нҠ№нһҲ мғқлӘ…кіј м§ҒкІ°лҗҳлҠ” мҡҙм „ мӨ‘ мӢңм•ј нҷ•ліҙм—җ мһҲм–ҙм„ , кё°мҲ ліҙлӢӨ мӢӨмҡ©м„ұкіј м•Ҳм •м„ұмқҙ лҚ” мҡ°м„ лҸјм•ј н•ҳм§Җ м•Ҡмқ„к№Ң.